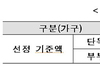민화는 우리 한 민족의 그림이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활 습속에 따라 제작한 대중적인 실용화이다. 민화는 그 당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린 생활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속·도교·불교·유교 등 종교 관련 그림이나 장식용 그림이 많다. 민화에는 순수함·소박함·단순함·솔직함·직접성·무명성·대중성·동일 주제의 반복과 실용성·비창조성·생활 습속과의 연계성 등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사실 민화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년~1961년)로서 그는 일본에서 민예운동을 일으킨 사상가이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이다.
그는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을 민화라고 정의하였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도 민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학자들이 민화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민화에 눈을 뜨고 연구한 분이 조자용(趙子庸, 1926~2000)이)박사이다. 조자용 박사는 “서민·평민·상민·민중 등 사회 계층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도화서 화원은 물론 모든 한국 민족들이 그린 그림”이라 해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많다. 민화에 온 삶을 투자하고 있는 최연우 민화 작가를 만나서 민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 그림 민화에 푹 빠져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최연우 민화 작가는 올해로써 20년간 외길을 걸어 오고 있다. 최연우 민화 작가는 20여 년간 서울에서 민화 그리기를 지도해 오다가 2021년부터 강화도에 정착, 민화를 가르치고 있다.
민화는 엄밀한 의미의 순수, 소박한 회화와 함께 도화서 화풍의 생활화·실용화를 모두 가리킨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염원, 신앙과 생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낸 전통 사회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벽사진경은 나쁜 귀신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로 나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무속과 도교계통의 그림은 장생도 종류로 십장생도·송학도·군학도·해학반도도·군록도·천리반송도·일월오봉도 등이 있다. 방위신으로는 청룡·백호·주작·현무·황제 등이 있고 12지신상의 민화는 벽사진경을 위한 민속에 얽힌 작품이다.

호랑이 그림으로는 작호도·호피도 등과 산신도에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 밖에 닭·개·사자 그림 등 벽사진경의 뜻을 지니고 있다. 용왕도는 봉황·기린과 함께 상서로움을 기원하는 그림이며, 칠성·별성·오방신장 등 무속과 관계있는 그림이 많다.
불교계통의 민화로는 산신각·칠성각 등에 있는 그림과 탱화·심우도 등이 있다. 유교계통의 민화로는 효자도·행실도·문자도·평생도 등 여러 계통의 그림이 있다.
장식용 민화로는 산수화를 비롯해서 화훼·영모·초충·어해·사군자·풍속화·책거리도·문방사우도·기명절지도 같은 정물화 등 많은 종류의 민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수호신, 군자(君子), 전쟁과 무용(武勇)을 상징하고 귀신을 물리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똑같이 등장하는 동물은 호랑이다. 특히 한국의 미술에서는 신통력을 지닌 기백 있는 영물(靈物)이나 해학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친구로 등장해 맹호도에서부터 희화화된 호랑이 민화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연우 민화 작가는 호랑이 그림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최 작가는 2016년 가회박물관 초등민화 그리기 대회 심사, 2016년 (사) 민화진흥협회 공모전 심사, 2011년 경향미술대전 장려상, 2012년 김삿갓 문화제전 전국민화공모전 장려상, 2015년 대한민국 민화대전 장려상, 2017년 한국민화진흥협회공모전 특선 외에도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개인 7회, 단체전 다수의 경력을 갖고 있다.
누구나 민화에 관심 있는 분은 환영한다면서 문화원과 까치와 호랑이 카페에서도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